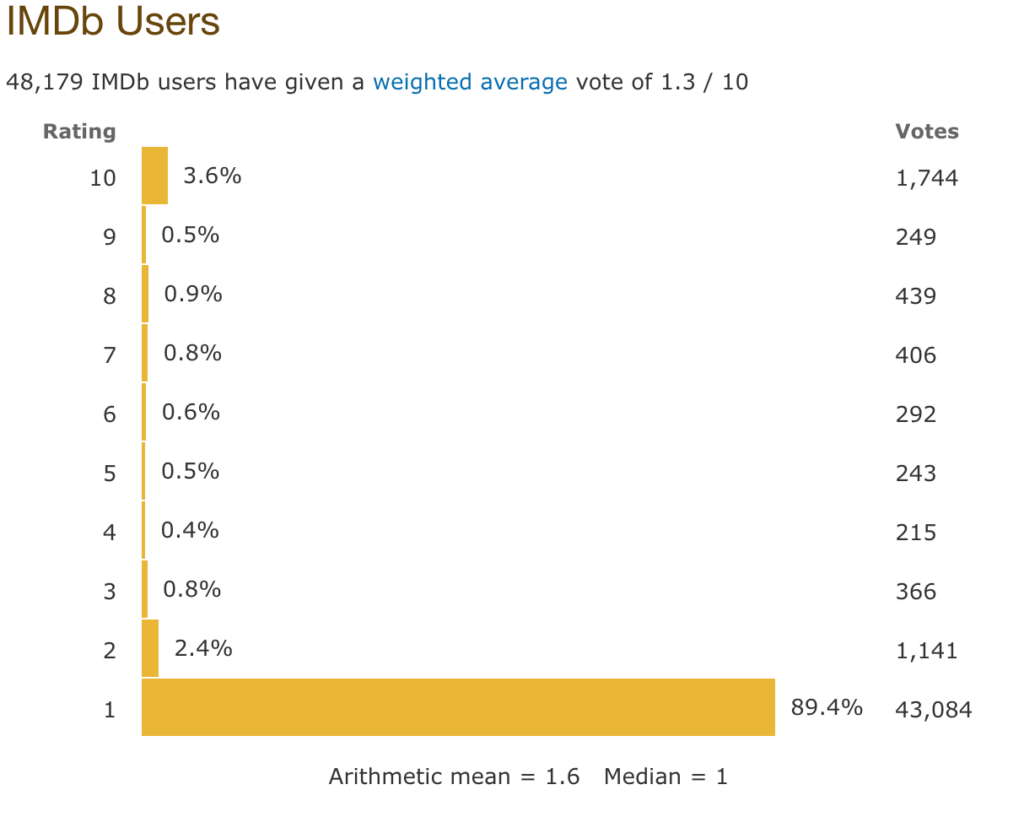2024년 11월 28일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크리스토퍼 콜드웰의 에세이 <This Maverick Thinker Is the Karl Marx of Our Time>는 뉴레프트저널에 기고한 에세이들로 유명한 독일의 사회경제학자 볼프강 슈트릭를 매우 상세히 소개한다.
슈트릭은 신자유주의 기획에 내포된 역설에 대해 명확한 통찰을 제시한다. 글로벌 경제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이 말하는 자유 시장이란 규제가 완화된 시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탈규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보기보다 훨씬 복잡하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규제란 인민들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사회가 민주적일수록 그 사회의 특성이 독특해지며, 경제적 규칙들이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기업들은 적어도 글로벌화 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자본과 상품은 국경을 넘어 마찰 없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법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민주주의는 일정 부분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가 일으키는 모순은 제국주의의 횡포로 이어지게 되는데, 제국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 글로벌화 규칙을 만드는 미국과 서유럽 사회 내의 지역 수준에서도 발생한다.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경제 정책들이 수립되고 불공정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글로벌 경제”는 일반 대중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간이다. 슈트릭은 1970년대 이후 좌파 정당들이 이러한 문제를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 권리와 생활 수준을 주된 관심사로 삼았던 기존의 구조에 인권과 ‘깨어있는 정신'(wokeism)이라는 원칙 집합과 같은 가치 체계를 홍보하는 데 관심을 둔 지식인들이 침투하여 전복시키는 것을 허용했다.
슈트릭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엘리트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저지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지만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민주주의가 활발히 살아 있다고 본다. 지난 20년 동안 적어도 진정한 대중의 정서를 반영하는 후보를 내세우는 정당의 경우 투표 참여율이 가파르고 꾸준히 상승했음을 지적한다.
좌파는 포퓰리즘을 받아들여야 한다. 포퓰리즘은 단지 글로벌리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투쟁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글러벌리즘이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진지한 정치적 움직임은 어떤 형태로든 포퓰리즘적일 수밖에 없다.